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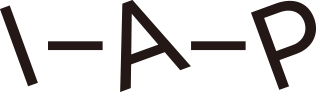
[4기 입주작가 박광수 개인전] Walking in The Dark
2014-06-14(Sat) ~ 2014-06-26(Thu)
4기 입주 박광수 작가의 개인전이 있습니다.
일상의 이야기들이 박광수 작가님만의 드로잉으로 선보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소 :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종로구 창성동 122-9, www.kunstdoc.com)
■ 기간 : 2014년 6월 14일 ~ 6월 26일 (월요일 휴관)
■ 시간 : 오전 11시 ~ 오후 6시
★ 오프닝 : 2014년 6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
□ 문의 : 02-722-8897
▼ 아래의 글은 네오룩(http://neolook.net)에서 가져왔습니다.
Walking in The Dark ● 새벽 2시, 흰 종이를 펼쳐놓고 검은 잉크를 휘휘 젓는다. 오른손에 펜을 쥐고 진하다 못해 질척거리는 잉크 저편으로 깊숙이 찌른다. 그리곤 현실에서 하나씩 주워 모은 관념의 돌멩이들을 날카로운 펜촉으로 조심히 깍아낸다. 습습 후후... 돌멩이와 파편들이 쌓여 언덕이 되고 언덕 속의 나무들은 숲이 되며 그 숲은 새벽 2시처럼 어둡다.
나뭇가지 ● 집 뒤편에 숲속을 조금씩 걷고 있다. 어두울 때의 숲속 산책은 밝을 때 보다 훨씬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뾰족한 것에 찔릴 수도 있다. 그보다 더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감수할 수 있다. 보이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바람은 스산하고 인기척은 없다. 유심히 주변을 살핀다. 나무를 더듬고 허공을 더듬으며 조금씩 걷는다. 길고 짧은 직선과 곡선들이 내 뺨을 스치며 지나간다. 검은 선들은 숲의 윤곽이 되고, 어두움이 되고, 나뭇가지가 된다. 이렇게 선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바꿔가며 이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 걷는 동안 내가 그려낸 작업들을 떠올려 본다. 나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렇게 어두운 숲을 헤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힘을 다해 정확히 대상을 포획해보려 하지만 대상은 나에게 명확히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매순간 진동하며 움직인다. 다만 나는 명료하지 않은 그 대상을 더듬더듬 거리며 매 순간 다르게 인지하고 다음 발이 놓일 곳에 집중할 뿐이다. 걷기가 계속 될수록 그날의 베개위에서는 숲을 걷는 꿈을 많이 꾼다.
유령 ● 좀 더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 나타났다 사라진다. 머릿속에 그것에 대한 많은 상상들이 불현 듯 등장하고 사라진다. 그것은 마치 영화에서 풍경이 페이드 아웃 되듯이 희미해지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실제와 상상 사이의 공간을 유심히 지켜본다. 나는 여러 사라진 것들과 곧 사라질 것들에 대해 떠올린다. 마치 끝말이어가기와 유사한 방식의 언어적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하나의 불연속적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검은 꽃, 검은 불, 허공을 유영하는 새무리, 추락하는 꿈, 타오르는 분노, 어둠 속에서 푸득거리며 나를 응시하는 날짐승, 어긋난 공간의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 젊은이의 눈 속에 총명함, 늙어버릴 육신의 미래, 죽음으로 사라진 이가 남겨놓은 사진의 먹먹한 풍경... 사라짐은 나에게 환상으로 다가오고 시련으로 다가온다. 어느 쪽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한 어중간한 태도로 사라짐을 더듬거린다. 무언가가 사라진 지점의 허공에 눈을 두고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걷는다. 그곳 에서 30년을 서 있었던 것 같다.
짐승 ● 수풀 저쪽에서 나와 같이 자신의 숨구멍을 오므리며 이쪽을 바라보는 존재가 있다. 바스락 거리는 것이 너구리나 고양이쯤 되는 것 같지만 최근 멧돼지의 출몰을 신문으로 접한 것이 생각나 다시 걸음을 멈춘다. 가만히 서 있다가 조금씩 자세를 낮춰 적당한 굵기에 기다란 나뭇가지를 집어 든다. 고대의 원시인이 사냥을 위해 짐승들을 앞에 두고 석창을 들었던 긴장감으로 어둠 속을 관찰 한다. 집중을 해야 할 때면 나는 스스로 만든 수제 펜으로 선을 긋는 감각을 떠올린다. 선을 그을 때는 최소한의 재료로서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잉크 펜을 주로 사용하는데 선의 물리적인 크기에 대한 제한을 넓히고자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수제 펜이다. 수제 펜은 나무막대와 스펀지를 잘라 만든 것으로 그 모양이 마치 석창과 같다. 그것은 때로 멈칫거리며 때로는 죽죽 나아가면서 그림의 대상을 성실하게 더듬는다. 근육의 떨림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것은 몸과 그림을 붓보다 더 밀착시킨다. 바스락 바스락 무언가가 기어 나온다. 들쥐를 입에 문 살쾡이다. 나를 보고 머뭇거리더니 저쪽으로 달려간다. 그나 저나 살쾡이라니... 살쾡이는 멸종위기라는데 오늘은 운이 참 좋다.
계속 같은 길 ● 같은 곳을 반복해서 걷는다. 시(詩)에서 반복되는 리듬 같이, 영화를 편집하다 잘려 나온 몇 컷의 필름들 같이... 계속 마주치는 동일한 나무와 바위들은 좀 더 자라나거나 줄어드는 것 같고 조금씩 그 위치를 옮기는 것 같다. 같은 대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릴 때 그 대상은 모두 다른 그림이 된다. 예측은 가능하지만 기계 같을 수 없는 손의 움직임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의 걸음은 매번 동일하지 않다.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으며 관찰한 나무와 바위와 이를 구성하는 선들은 모두 새롭게, 미묘하게 변화 혹은 진동하는 듯 보인다. 하늘이 좀 밝아진 것 같다. 이 시간쯤 되면 내가 길을 잃은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걷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도 한다. 이렇게 빙글빙글 걷다보면 작업실 책상 앞에 무사히 앉아있는 나를 발견한다. 오래전에 쓰여 진 어떤 책에는 적들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주위를 빙빙 돌며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오래전에 쓰여 진 어떤 책에는 적들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주위를 빙빙 돌며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