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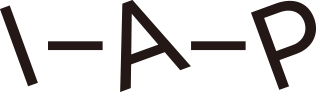
[7기 최선 개인전] 멀미
2017-03-07(Tue) ~ 2017-04-05(Wed)
씨알콜렉티브
최선 개인전 <멀미 Sickness>
2017. 03. 07 - 04. 05
씨알 콜렉티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20 일심빌딩 2층)
오프닝 _ 2017.03.07.Tue.17:00
Ⅰ. 예술이란
최선 : 나는 “예술”이 사라져 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술품을 만들고 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예술적”이지 않은가.
I : 이런! 제 생각엔 작가 최선은 시니컬하게 예술의 무용론을 말하기엔 삶과 예술에 대한 집착과 열정이 너무 많고, 끊임없이 뭔가 다른 ‘예술과 현실’을 꿈꾸며 은근과 끈기로 끝까지 작업할 것 같은데요? 사실, 예술이 문제라기보다(실제로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너무 ”예술적“인 ”현실“이 못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괜히 예술 탓을 하고 있군요. 당신이 그리는 삶의 환상은 무엇인가요? 혹시 호혜, 평등, 사랑 뭐 이런 걸로 가득한 세상,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단지 이런 정도의 사회만 아니면 된다는 사후 비판론인가요?
Ⅱ. 예술은 본능
C : 최선 작가의 삶에 대한 애착은 너무도 강하다. 그리고 그에게 예술은 본능이다. 그의 2000년대 초기 작업을 살펴보자. 그의 작업은 육체의 분비물을 매개로 감정을 그린다. 그리고 그 분비물은 분을 삭이고 좌절을 해체하는 “삶”의 변증법적 메타포로 사용된다. 숨, 입김, 침, 피똥에 이르기까지 그 소재선정의 역함과 다채로움은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붓보다는 몸, 특히 입이나 손바닥을 사용하여 화면에 불어대거나 비벼대고, 피, 모유, 은행, 껌, 김치 국물 등이 가진 문화적 뉘앙스와 함께 끈적끈적하고 역한 냄새를 캔버스에 묻혀서 비벼댄다. 그의 원초적이고 초직접적이며, 동물적인 감각행위는 주어진 환경, 인간을 조정하고 감시하는 권력, 학습과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극한 몸부림이다. 그의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 특히 한국미술계의 고질적 이분법적 행태와 양극화, 아카데미에서부터 역사와 담론이 증명하는 서구·남성 중심적 사고에 대한 불만의 몸짓이자 이를 해체하고자 하는 의도적 충격요법인 것이다. 얼어붙은 세상을 입김으로 녹이기 위해 얼음이 꽁꽁 언 강 위로 뛰어 나갔고(극점 pole, 비디오 1분, 2005), 실제로 6개월간의 젖동냥을 하여 모은 적은 양의 모유로 흰 그림을 그렸다. (동냥젖 White Painting from Milk, 캔버스 위에 얻은 모유, 46×53cm, 2005, ‘캔버스 위에 남겨진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모유의 숭고함이 악취의 역겨움으로 전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작가는 작업의 의도를 밝혔다.) 그가 예술을 생산하는 방식은 배설에 가까웠다.
III. 멀미
최선 : 최근 잃어버렸던 친누이를 찾았다. 중국에서 누이와의 재회는 너무도 극적이었다. 마침 집에서 발견된 누이의 구겨진 스웨터는 나프탈렌이 뒤엉켜 팔 한쪽이 접힌 채 딱딱하게 굳어져있었다.
I : 그 굳어진 스웨터는 누이의 빈자리가 편치 않았음을 상징하는 것 같다. 마치 우리 주변의 일그러져 고착된 모습이기도 가족과의 삶을 포기하고 이웃나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굴곡진 모습이기도 하겠다.
최선 : 한국사회가 좌우로 편 가르기를 하고 대립하는 것을 보면 멀미가 날 것 같다. 신기하게 빨간 불빛과 파란불빛을 대립시키니 오묘하게도 눈에서는 마젠타 색으로 보였다.
I : 깜박이는 양극화된 빛을 환상으로 덮어버려 멀미를 잠시 잊게 해주는 예술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실제로 당신은 한쪽 청력의 부족으로 물리적인 멀미를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이 정도 예술로는 마취되지 않는 것이죠.
Ⅳ. 직진
F : 최선은 직진만 한다. 그런 그에게는 현실이 멀미난다.
2009년 아르코미술관 신진작가양성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최선은 나에게 자신의 포트폴리오 드래프트를 내밀며, 내 의견을 듣고자했다. 포트폴리오에는 한국미술계의 주류에 대한 맹비난, 조소, 소위 저격수로의 실험들이 상당히 그로테스크하게 실행되었다. 아카데미와 결탁한 당시 미술계권력에 대한 비난 섞인 퍼포먼스로서 “날것”의 직선적이고 날 선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랬던 그가 일본 뱅크아트(Bank Art 1929) 레지던시를 다녀오면서 그의 직전행보에 살짝 브레이크를 걸었다. 타 문화와 언어 속에서 소통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요코하마, 타이베이, 뉴욕 ISCP(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의 경험으로 그의 사고를 확장시켰다. 특히 2014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 참여 작가로 전시하면서 다양한 관객과의 소통을 인식했고, 투자 한만큼 거둔다는 미술자본의 속성을 경험했다. 한국에 돌아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현재 창동 레지던시에 참여하면서 많은 전시기회를 스스로 획득해내었고, 좋은 작가들과 친분을 맺어 외로운 저격수에서 겸손한 경주마가 되었다.
그가 요코하마에서 내게 SNS로 트리엔날레 전시참여에 대한 기쁨을 전했고, 나는 그에게서 받은 전시된 사진과 작업내용을 듣자마자 나중에 서울에서도 나와 전시한번 하자고 했다. 그것이 이번전시에서 실현되었다.
나는 최선 작가를 “올곧은” 작가라고 평가하고 싶다.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작가의 인품, 성격, 취향 등은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특히 말투와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바름”에 경직되어 있는지, 커브가 안 통하는 직진 작가인지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바르다, 올곧다는 평가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힘들게 세상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약간의 비꼼이 덧씌워져 있다. 동시에 낭만적이게도 바름에 대한 무한 기대도 잔존한다. 그의 직진성향이 동시대가 요청하는 예술실천과정에서 약과 독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함께 제공할 것이다. 나는 그의 작업에서 직설적인 메시지와 함께 그의 진심이 관객에게 전달되길 기대한다.
Ⅴ. 개인전 멀미
최선 :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 등 30여 식당의 뜨거운 찜통 속에서 뼈를 골라내는 일이 나에게는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동아시아가 과거 어느 시점에는 커다란 하나의 커뮤니티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상상을 해봤다… 10년 후에 당신과 내가 마주할 동아시아의 식탁은 과연 어떤 것일까? 지금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혹시 서로가 서로의 뼈를 뜯고 있지는 않을지 모를 일이다.
D : 최선 작가의 “동아시아의 식탁”은 2014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서 처음 선보였던 작품으로 이번 개인전, “멀미”를 위해 재설치 된다. 작가는 요코하마에 체류하면서 동물 뼈로 국물을 우려내는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식문화에 주목하였다. (물론 뼈를 우려내는 식문화가 동아시아만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대만, 중국 등 30여 식당에서 뼈를 수집했다. 찜통에서 뼈를 골라내어 살을 벗기고 씻는 일종의 고된 작업을 하면서 국가를 경계로 실리를 추구하고 대립하는 현실이 그는 못마땅하다. 국가끼리 경쟁하는 상황에서 뼈를 뜯는 상상을 하다니…
그는 요즘 인천 차이나타운과 지인의 식당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뼈를 구하고 다닌다. 그리고는 작업실에 뼈들을 펼쳐놓고 건조하고 있다. 발로 뛰고 손으로 비벼대는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 노동과정은 그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송은아트스페이스 전시에서는 재를 손에 묻혀 넓은 벽 전체를 비벼대며 칠하다가 손바닥이 다 까지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도 박제를 전문으로 하는 친구에게서 배운 소독과 방부과정을 통해 뼈들을 깨끗이 손질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전시는 땀내와 소독 냄새, 그리고 나프탈렌 냄새가 뒤엉켜 실제로 멀미를 유발할지 모른다. 삶에서 분비물을 억제하는 인위적 방법들에 능통한 그가 작업에서는 억제코드가 없다. 한국에서 이 “뼈들”의 전시는 또 다른 시각과 맥락들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도살되는 돼지들의 핑크빛 일련번호를 티셔츠, 비닐, 천 등에 찍어내어 비인간적임을 드러내었던 그의 이전작업과 연계할 수도, 현재 상황과 맞물려 무참히 도살되어 흙속에 묻히는 구제역 걸린 소, 돼지들을 떠올릴지 모른다. 또는 식용을 위해 비참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을 떠올리며 우리의 식욕을 떨어뜨릴지 모른다. 다양한 논의들이 이번 전시 “멀미”를 통해 생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추가 전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