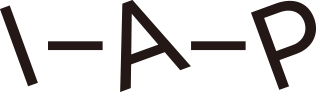이민우는 ‘사진’을 다루는 ‘사진작가’로 불리지만, 사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개념과는 다른 작업을 선보인다. 사진에 ‘찍힌 대상’ 즉
피사체가 존재하지 않는 작품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사진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은, 작가가 카메라를 사진의 주제가 되는 피사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셔터를 눌러 필름을 빛에 노출시키고, 이 필름을 현상하며, 인화지에 이미지를 확대, 인화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는 현상과 인화라는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변환 과정이 사라졌는데, 이민우 작가는 바로 이 사라진 지점을 이번 작업의 출발점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작가는 인화지 혹은 감광지 위에 드러난 이미지 자체보다는 ‘이미지를 드러나게 만드는 과정’에 집중한다.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자리 잡은 표면 간의 긴장 관계를 탐구하고 그것을 작업화하는 것이다. 그의 작업에서 피사체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회화적 공간(pictorial
space)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화학적 처리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작가는 사진이 ‘정체성 없는 매체’
그리고 ‘슬픈 매체’라고 말한다. 사진은 거울처럼 대상 없이 존재할 수 없거나 존재하기 힘든 매체로, 대상을 표방하고 표면에 담기만 하지, 사진
자체의 본질적인 물질이나 물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사진의 존재 방식을 다르게 다루어 보려는 시도이다. 그의 작업 과정에서 이미지는 흔히 이미지의 자리라고 여겨지는
‘표면’으로 곧장 떨어지길 거부한다. 오히려 이미지는 ‘끈적’하게 흘러내리는 화학적 과정에서 이미지 고유의 자리를 느리게 요구하고, 표면에 붙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표면과 이미지 ‘사이’를 비집고, 그 사이에 안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