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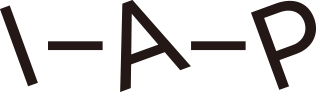
2016-10-01(Sat) ~ 2016-10-05(Wed)
13:00-18:00
C 공연장 G1갤러리
2016. 10. 1 (Sat) - 10. 5 (Wed)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13 : 00 - 18 : 00 (휴관일 없음)
본 전시는 드라마터그 전강희 작가와의 스터디를 거쳐 기획 및 제작되었다. 텍스트는 장 뤽 낭시의 <코르푸스>와 <나를 만지지 말라>, 정영효 시인의 <계속 열리는 믿음>으로 선정하였다.
3개의 책은 형이상학적 가치(사랑, 윤리, 진리등)에 다가가는 태도를 기술함에 있어 역설적인 구조를 선택하는 텍스트들을 고른 것이다. 전강희 드라마터그와 나는 스터디 과정을 통해 예수와 마리아의 놀리메 탄게레(나를 만지지 마라)에피소드, 믿음의 구조, 몸(코르푸스)등을 같이 공유하면서도 개인의 체험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하였고, 해석을 동일시 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멀어졌으며 동일시의 순간은 말보다 침묵을 공유하게 되었다. 다른 차원에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같아질 수록 우리는 멀어져야 했다. 결코 하나로 포괄되지 않는 해석의 형태들을 발견하며 나는 전강희 드라마터그의 도움을 빌어 자연스럽게 배우 없는 연극 혹은 관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사라지는 형태 등으로 기존의 연극이 갖는 틀을 허물고 있는 ‘포스트 드라마’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포스트 드라마가 상영하는 파편적인 장면과 에피소드식 서사는 관객들에게 적극적인 해석의 공간을 열어둔다. 이로써 관객은 각자가 경험했던 개인의 시선과 서사를 토대로 해석에 개입하고 서사를 직조하여 자신이 체험하는 장면을 완성해나간다. 즉 서사를 직조하는 주체는 더 이상 무대가 아닌 관객이며 서사의 온전함 대신 서사의 파편화는 다른 차원의 해석과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 프로젝트는 장면을 무대화하고 또한 전시하는 스튜디오적 성격을 갖는다. 공간은 무대가 시작하기 이전의 에필로그이자 이미 끝나버린 프롤로그이다. 공간에 입장하는 관객은 해석의 타임라인이 작동하는 카메라가 되길 바란다. 내가 구성하는 공간에는 몇 가지의 설치물과 조명, 텍스트(정영효의 시 <계속 열리는 믿음>)들로 구성되는데 다각도의 시선과 방향, 동선으로 관람 할 수 있다. 공간에 분산되어 자리잡은 설치물과 오브제들에 붙여지는 제목은 없으며 서로를 잇는 관계 또한 느슨하다. 오브제들은 우리가 목격하는 장면이자 주변의 흩어진 이야기들이다. 우리 삶이 그렇듯 내가 서있는 곳에 따라 이야기는 원근을 갖고 겹쳐지며 구조를 갖는다. 서사의 실체 혹은 서사의 차원은 무척이나 가변적이다.
사랑, 진리, 믿음, 우리의 몸과 존재의 의미 등을 묻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일수록 역설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서사를 제공하거나 상영할 수 없다. 의미에 가 닿지 못할수록 거기에 진리가 있다. 어쩌면 비어있는 그 자체에 대한 확신만이 남아있다. (장 뤽 낭시, <나를 만지지 말라>, 인용) 나는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확신을 끊임없이 갈구하지만 떠도는 그림자만이 남은(장 뤽 낭시, <코르푸스>인용), 완성되지 않는, 역설만이 남는 곳에서 허무와 가능성을 동시에 본다. 다만 해석이 열린 곳에 나를 벗어난 해석의 차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가 부활했을 때, 부활한 예수를 마주하는 요한, 토마, 마리아의 에피소드는 흥미롭다.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비어있는 무덤과 수의가 버려진 빈 무덤을 보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보지 않고도 확신한다. 토마는 눈앞에서 예수의 몸을 보았지만 그의 몸을 만졌을 때 확신한다. 그리고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서 흐느끼며 정원지기에게 예수의 행방을 묻는다. 정원지기는 대답 대신 “마리아야”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를 알아보고 몸을 잡으려 하자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나를 만지지 마라(Noli me tangere)”. 그리고 붙드는 대신 자신의 부활을 전하라 한다. 요한, 토마, 마리아는 서사의 차원을 벗어난 것을 마주했고 각자의 믿음을 직조해간다. 이 세 사람의 해석의 차원은 모두 다르지만 각자 충실하다. 그들의 각기 다른 제스쳐가 귀결되는 지점은 아마도 견고한 믿음은 역설적이게도 계속 열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들의 견고함으로 인해 계속 그대로 인 것들을 허물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영효, <계속 열리는 믿음> 인용) ■ 염지희